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이루어진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우선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낸 기술이다. 즉,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은 모두가 주목하는 기술로 떠올랐으며, 현재도 사회 여러 분야와 접목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관련, 그 처음을 논하자면 튜링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튜링 테스트란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으로 그의 논문 '계산 기계와 지성(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을 통해 소개되었다. 그가 제안한 판별법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컴퓨터와 사람 B, C가 각각 존재한다고 하자. 이들 모두는 격리되어 있으며, 심판 역할을 하는 C는 이 둘과 대화를 나눈다. 이때, C는 자신이 컴퓨터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만약, C가 컴퓨터와 인간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해당 컴퓨터는 사고할 수 있는 기계 즉, '생각하는 기계(Thinking Machine)'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튜링의 견해는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튜링이 튜링 테스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험 방법이나 판별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관련 기사: [인공지능 인물] ① - '생각하는 기계'의 첫 주자, 앨런 튜링
이후, 1956년, 미국의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주관한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6주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는 프랑크 로젠블라트(Frank Rosenblatt)가 인공 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퍼셉트론 이론을 발표하였다. 인공 신경망이란 인간의 뇌의 사고 처리 능력을 모방한 기계학습 모델로 로젠블라트는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퍼셉트론을 구현해 내었다. 이는 딥러닝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인공지능 연구는 침체기를 겪게 된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의 부족이나 알고리즘 구현의 한계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공 지능 연구는 정체기를 맞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1990년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가능해졌다.
이에 더하여, 인공 신경망에 기반한 기계학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딥러닝 기술이 주목받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정보 처리 능력의 향상에 힘입어 인공지능은 오늘날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기술 중 하나가 되었다.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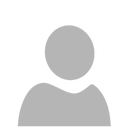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https://cwn.kr/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